8쪽. 지금-시간에 함께 있기 : 『여름의 잠수』
- 그림책 처음 일기: 희음
- 2021. 3. 15. 1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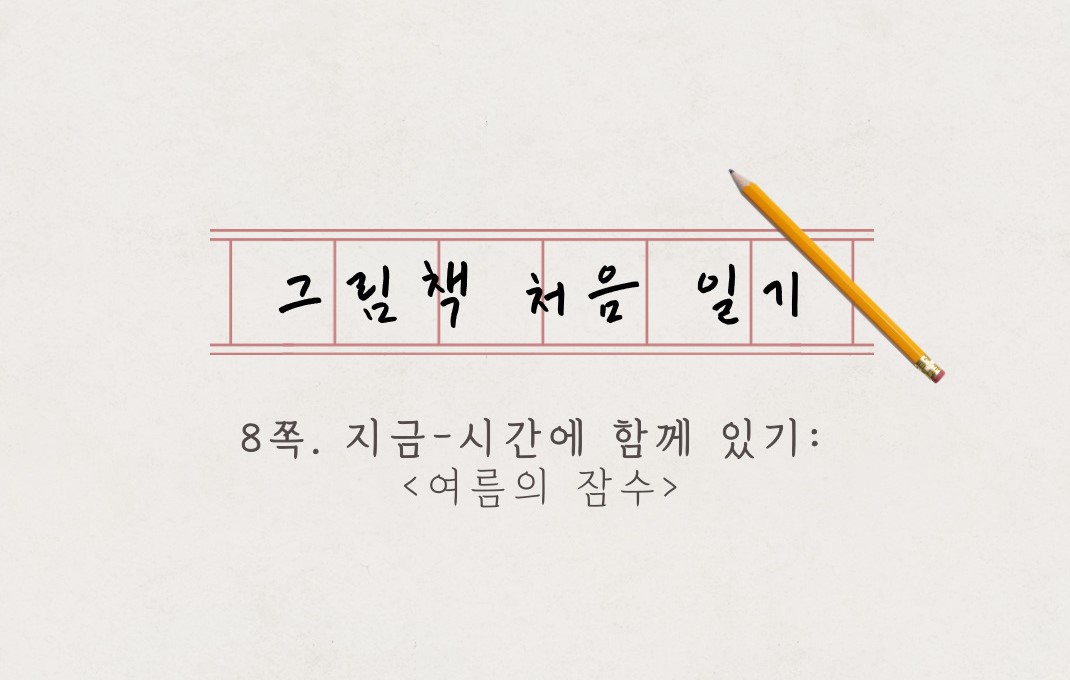
“왜 어떤 사람은 살고 싶지 않을까?”
그림책의 화자는 단발머리를 한 여자 어린이다. 위 문장은 이 어린이가 아빠를 떠올리면서 자문하는 말이다. 어린이는, 개가 있고 나비가 있고 하늘이 있는데 어째서 살고 싶지 않을 수가 있는지 묻고, 아빠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묻는다. “어떻게 아빠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까? 내가 있는데.” 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말하던 사람이 별안간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든 이렇게 묻게 되지 않을까. 나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마음이 변한 건가. 혹시 내 존재를 지우기라도 한 건가.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어린이의 아빠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 어떤 마음의 병은 교통사고처럼 예고도, 이유도 없이 들이닥친다. 그것은 나의 의지와 의도를 넘어선다. 사랑의 항상성과 균형감각을 앗아간다. 탈취의 과정에 있어 나의 허락이나 수용 따윈 고려 요소가 아니다.
어린이는 병원 입원을 위해 집 떠난 아빠의 뒤에 남아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가 아빠를 세상에서 오려낸 것 같다”고, “아빠가 앉았던 자리에 구멍이 나 있다”고. 미처 슬퍼하거나 준비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레 뚫려버린 구멍의 시간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린이의 아빠에게도 찾아온 시간일 것이다. 예고도, 이유도 없이 한 존재의 크기만 하게 구멍은 순식간에 자라났을 것이다.
입원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 구멍이 무엇인지 나는 어렴풋이 안다. 진료를 받으며 나의 상태와 상황을 조목조목 털어놓고, 처방 받은 약을 사료 챙기듯 꼬박꼬박 먹어도, 내가 왜 계속 살아야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던 시간. 살아 있는 이유는 하나뿐이었다. 단지 죽기를 실행할 기운과 에너지가 없다는 것. 사람들은 나를 따돌린 채 저들끼리만 웃고 사랑하고 나누고 기도했다. 그 시간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건 이런 질 나쁜 꿈일랑 다시는 꾸고 싶지 않다는 마음뿐. 물론 지금도 나는 수시로 불안하다. 언제 다시 그 무시무시한 구멍이 내 마음을 먹이로 삼을지 몰라서.
그렇지만 분명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던 때와는 다르다. 그 시간은 내게 여전히 어렵고 막막할 테지만 그 시간이 언젠가는 물러갈 것이라는 사실만은 안다. 물러갈 거라는 사실을 ‘사실’로 믿는다. 그 믿음에 기대어 나를 믿으며 나의 다음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믿는 내 곁의 사람들 역시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걸,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여름의 잠수』도 어쩌면 이 모든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 어느 날 아빠가 더 이상 면회를 원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어린이는 매일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간다. 어린이는 거기서 사비나라는 여성을 만난다. 그녀 역시 그 병원에 머물고 있는 환자다. 가운 안에 수영복을 입은 사비나는 어린이에게 수영을 하겠냐고 묻는다. 어린이는 주위를 둘러보지만 어디에도 바다는 보이지 않는다. 그곳에는 “토사물 색 같은 분홍 벽지”와 “슬픈 사람들”밖에 없다고 어린이는 생각한다. 분명 따뜻한 빛깔을 띠고 있었을 핑크색 벽지가 어린이에게는 전혀 따뜻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아빠가) 나를 잊을 수 있지?” 하는 생각으로만 꽉 찬 슬픔의 눈으로 어린이는 그 모든 걸 바라봤을 테니까. 하지만 어린이는 사비나와 자꾸 만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이는 매일 병원을 찾았고 매일 기다렸으니까. 사비나는 어린이에게, 같이 기다려주겠다고 말한다.

여전히 바다는 멀었지만, 두 사람은 나무 아래에서 만나 수영 연습을 한다. 사비나가 함께 기다려주겠다고 한 것처럼 어린이 역시 수영선수였던 사비나의 시간 아래에 함께 놓여, 그녀가 꿈꾸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다. 햇빛 아래에 누워 이따금 다른 세상으로 잠겨 들어가는 사비나를 어린이는 그 곁에서 매번 가만가만 기다린다. 빨간 수영복을 나눠 입고 초록 풀숲 위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 그늘 졌으나 충분히 부드러운 눈빛으로, 잠시 다른 세상으로 떠난 한 사람을 바라보는 나머지 한 사람. 이 페이지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기다린다는 건 뭘까?
기다린다는 건 어디로도 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어’주는 게 아닐까. 언젠가 돌아올 더 좋은 날뿐만 아니라 지금의 고통 곁에 있어주는 것. 그/그녀의 고통이 나의 깜냥으론 도무지 알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고통 곁에 닿을 수조차 없다고 해도. 즉 지금 누군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혼란과 슬픔을 없는 것으로 만들면서, 도래할 다음 시간만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울퉁불퉁하고 난삽해진 시간까지 그/그녀의 것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말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그 누군가의 지금-시간을 함께 감내하기로 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통과했던 고통의 시기, 나를 믿는 내 곁의 사람들이 기다려주었던 것 역시 나의 지금-시간과 다음 시간 모두가 아니었을까.
아빠가 자신을 잊은 게 아닌지 의심될 때도, 아빠가 더 이상 면회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정을 알려왔을 때도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던 이 그림책의 어린이처럼 그렇게 한 존재의 곁에 ‘있는’ 일. 이런 것이 온전한 기다림이라면, 기다림은 어쩌면 아무런 희망 없이 사랑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저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그곳에 있고, 내게 사랑할 힘과 움직일 힘이 남아 있으니 사랑하고 행동하는 것.
어린이는 말한다. 아빠는 나무 같았다고. “겨울에는 죽은 척했지만 여름이 오면 다시 살아났다”고. 여름이 되어 돌아온 마른 몸의 아빠를 어린이는 꼬옥 끌어안는다. 그 장면은 정말이지 한 아이가 빼빼한 나무 한 그루를 안는 풍경처럼 보였다. 잠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나무, 언제 또 겨울의 찬바람에 삼켜질지 모르는 나무. 그런 불안 때문에 우리는 더 힘껏 누군가를 끌어안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사랑할 수 있을 때, 기다릴 힘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곁에 서려 하는지도 모르겠다.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 불안과 어둠과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끌어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뿐이라면 그 한 가지를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 하는 것이 우리의 저항이자 환희일 거라고.

'그림책 처음 일기: 희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0쪽. 1대 1이라는 위험한 결합 : 『행복을 부르는 고양이』 (0) | 2021.04.26 |
|---|---|
| 9쪽. 상상의 힘 : 『할머니의 팡도르』 (0) | 2021.04.05 |
| 7쪽. 친구가 되는 꿈 : 『장수탕 선녀님』 (2) | 2021.03.01 |
| 6쪽. 돌봄의 회로에 대하여 : 『괜찮을 거야』 (0) | 2021.02.01 |
| 5쪽. 미움을 품고, 키우고, 내보내는 일 : 『미움』 (0) | 2021.0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