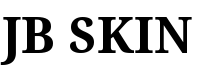그림책리뷰 (7)
14쪽. 다정한 얼굴들을 기억해내기 : 『태어난 아이』
- 그림책 처음 일기: 희음
- 2021. 8. 2. 14:06
12쪽. 싸움 곁에서 함께 싸우기 : 『엄마, 달려요』
- 그림책 처음 일기: 희음
- 2021. 6. 7. 10:09
11쪽. 돌봄의 운동장을 상상하기 : 『엄마의 의자』
- 그림책 처음 일기: 희음
- 2021. 5. 17. 13:54
10쪽. 1대 1이라는 위험한 결합 : 『행복을 부르는 고양이』
- 그림책 처음 일기: 희음
- 2021. 4. 26. 14:58
9쪽. 상상의 힘 : 『할머니의 팡도르』
- 그림책 처음 일기: 희음
- 2021. 4. 5. 16:01
8쪽. 지금-시간에 함께 있기 : 『여름의 잠수』
- 그림책 처음 일기: 희음
- 2021. 3. 15. 15:05
7쪽. 친구가 되는 꿈 : 『장수탕 선녀님』
- 그림책 처음 일기: 희음
- 2021. 3. 1. 12:41